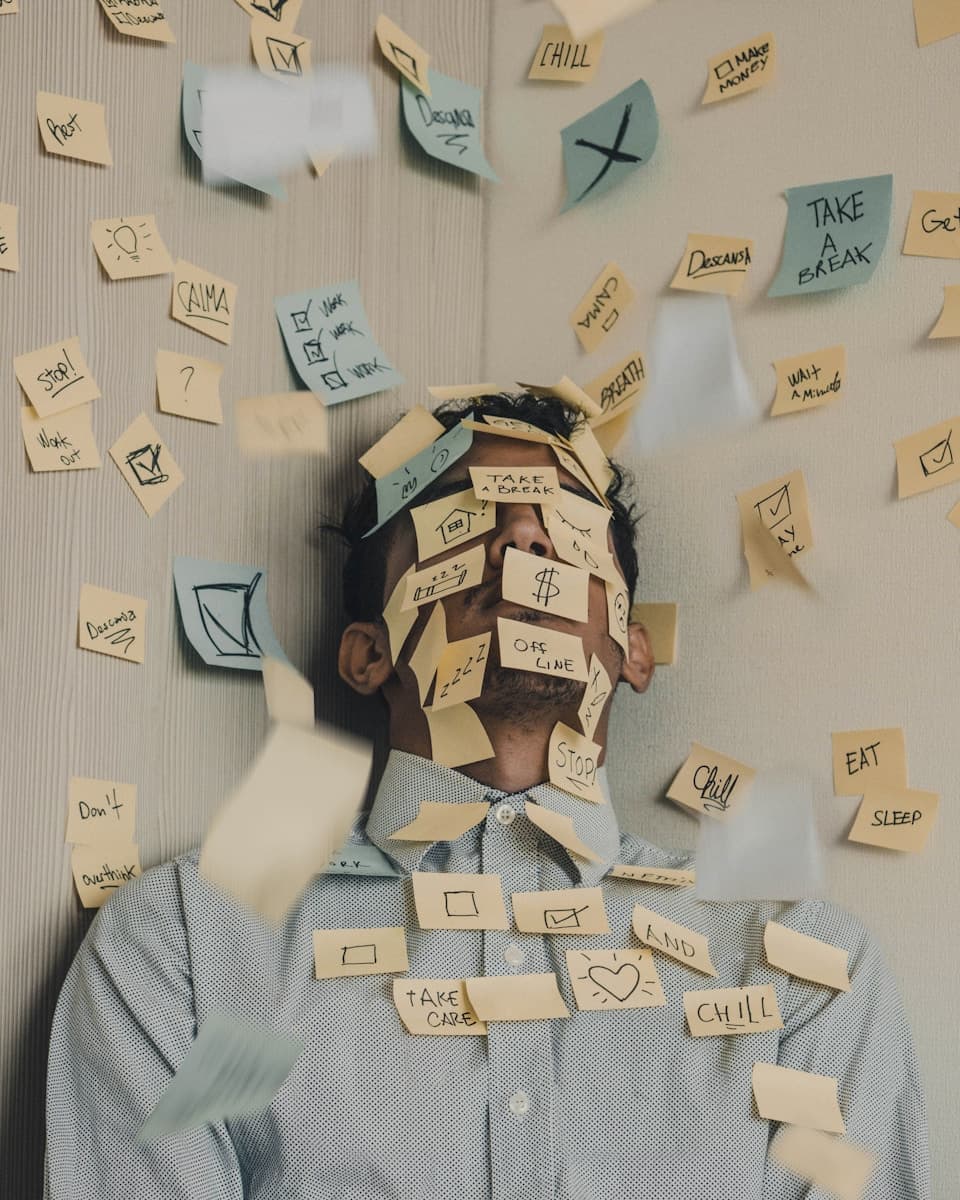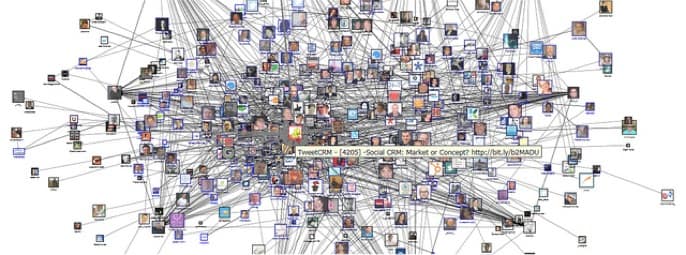|
[웹 마스터의 길닦기]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(1)
2005/02/14 23:27
|
인스팟 기획실 임명재
웹을 다루는 사람치고 시간에 쫓기는 스트레스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. 특히나 에이전시에 있는 사람들은 늘 바쁘고, 분주하고, 정신없고, 그야말로 미친듯이 일을 하고 있다. 일정은 언제나 ‘Mission Impossible’이며 그나마 짜여진 일정도 제멋대로 바뀌기 일쑤다.
“다음 주 까지 끝내야 하는데 가능하죠?”
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한 달에 두 세번씩은 꼭 생기는 것 같다. 가끔은 다른 판에서도 이런 말들이 거침없이 오고가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. 일이라는 게 사정이 생기다보면 어느 분야에서야 긴급상황이라는 게 발생하겠지만, 유독 웹과 관련된 곳에서는 이런 무대뽀식 일정가늠이 일상화된 건 아닐까 싶다.
모든 일은 시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일을 진행하지만, 계획은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 수정될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. 그러니 웹 분야에서 유독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주장한다면, 아마 몇 몇 분들은 엄살이 지나치다며 비웃을지도 모르겠다. 하지만 웹 관련 일들이 유별나다고 우기고 싶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. 정말로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만 같은 이 분야만의 부조리한 실상들을 되짚어보도록 하자. 시시콜콜이 꼽자면 끝이 없을 테니 많은 동업자들이 공감할 몇 가지만 꼽아보도록 한다.
1. 작업 기간이 짧아도 너무 짧다.
애초에 주어진 작업 기간이 짧다. 정보시스템과 연관 되는 웹 SI(또는 eBI) 성격의 일들의 경우야 다소 넉넉한 시간이 주어지는 편이지만, 회사 웹사이트나 브랜드 사이트, IR 사이트, 특정 프로모션을 위한 임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길어봐야 1달 이내에 작업을 완료되도록 일정이 짜여지는 경우가 많다. 웹 관련 분야는 항상 광고나 마케팅, 영업, IR 등 회사의 핵심 사안의 부분이거나 하위 요소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해서, 전체 일정을 수립하는 데 있어 웹을 위한 고려는 아예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.
새로운 브랜드의 제품을 출시하면서, 광고 촬영일 그 다음 주말에 제품 브랜드 웹 사이트가 런칭되도록 일정을 잡는 발상이 가능한 까닭은 무엇일까?
“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…?”
이런 반문을 대하면 요술램프의 지니를 소개해주고픈 심정이 된다. 울고 싶은 데 뺨 맞는 격으로, 그 다음주에는 광고가 방영될 계획이라고 한다. 도대체 언제 시안을 잡고, 언제 검토를 하고, 언제 디자인하고, 코딩하고, 개발하고, 테스트를 한단 말인가!
2. 웹 관련 일은 수정이 쉽다고 여긴다.
이걸 1번으로 올릴까 하다가 애초의 태생적인 문제를 얘기해야겠기에 순서를 바꾸었다.
하지만 웹 관련 일들의 일정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까닭은, 웹 작업 결과물은 수정을 하는 데 ‘몇 일이면 되지 않나?’ 하는 상식아닌 상식이 있기 때문이다. 그리고 또 우리들은 그 몇 일 안에 수정을 다 해낸다. 전에도 그랬고, 지금도 그렇고, 앞으로도 그럴테지만, 절대로 불가능해보이는 일을 우리는 해낸다. 마치 건설사들이 뚝딱 몇 일만에 건물을 올리듯… 온갖 부실이 숨어있는데됴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. 일단 보이기에 문제만 없으면 된다는 식이다. 일단 오픈해놓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수정하면 된다는 게 거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다. 아니 웹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 듯이 여기는 관행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.
아직도 이 분야의 일은 너무 몰라서 또는 너무 잘 알아서 탈인 선무당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들의 섣부른 판단이 재앙을 낳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다. 그 선무당들의 무계획과 무책임 덕분에 애꿎은 웹 디자이너와 웹 개발자는 허구헌날 밤샘을 하게 된다. ‘이거 내일까지 수정해주세요, 되죠?’ 하면, 우아한 백조처럼 ‘네… 해드려야지요.’ 하고 대답을 하고 미친듯이 물갈퀴질을 하는 것이다!
3.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란다.
계획을 수립할 때는 웹 관련 항목들은 수 많은 목록 중 저 아래쪽의 몇 줄에 불과한데, 일이 마무리 되어갈 때 쯤엔 온갖 문제점들이 집중되는 마루타가 되어 있다.
‘이게 왜 빠졌지?’
‘이건 컨셉이 잘 못 된거 아니야?’
‘이 카피 누가 쓴거야?’
‘아무리 봐도 약해…’
‘이건 컨셉이 잘 못 된거 아니야?’
‘이 카피 누가 쓴거야?’
‘아무리 봐도 약해…’
눈이 벌개져랴 작업을 하고 결과물을 가져갔을 때 이런 저주에 가까운 멘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진다. 억울함에 혈압이 높아지지만 꾸욱 누르고 회의록을 뒤적뒤적 해서 왜 이렇게 방향이 잡혔는지를 설명한다. 그럴 때면 거의 어김없이 결정타가 날아온다.
“아니 그런 건 알아서 해주셨어야죠?!”
어지러이 널린 회의자료, 스토리보드 들을 주어담으며 전화를 건다.
‘수정 사항이 좀 많아서요. 모두 기다려주세요. … 아무래도 밤새야 할 것 같은데요…’
웹 마스터는, 특히나 기획자는, 전략 기획에 마케팅에 광고 PR은 기본이고, 제품 카탈로그와 고객사 경영진의 취향까지 한 줄로 꾀차고 있어야 한다. 아니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이다. 척하면, 줄줄줄줄 끝까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.
(쓰다보니 넋두리처럼 풀려가는 이야기가 길어집니다. 다음 편에 4가지 정도 이야기를 덧붙여 볼까 합니다.)